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By John Sears – Own work,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침묵으로 말하는 작가, 한강
한강은 말보다 침묵의 여백을 더 집요하게 응시하는 작가다. 그녀는 격정적 서사보다는, 삶을 관통하는 고통의 결을 조용히 더듬으며 독자에게 섬세한 흔들림을 전해왔다. ‘말하지 않는 것’을 언어로 옮기는 이 작가는, 작품마다 인간의 본성과 윤리의 경계, 존재의 조건에 대해 질문한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시인으로 문학을 시작했으며, 이후 소설로 영역을 옮겨 『검은 사슴』,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흰』 등 깊이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수상은 한국 문학을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이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그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의 중심에 발을 디뎠다.
『채식주의자』 – 말보다 강한 침묵의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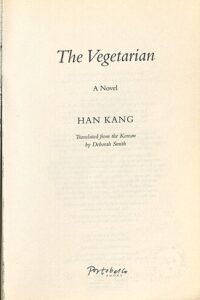
한강, 『채식주의자』 (2015), public domain.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육식과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정상’이라 불리는 모든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이자, 어쩌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나려는, 절실하고 고요한 몸짓인지도 모른다.
작품은 세 장으로 나뉘며, 각 장은 서로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영혜’라는 여성을 비춘다.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영혜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몸의 감각조차 인간의 것을 벗어나 식물로 변화하려 한다. 영혜는 침묵 속에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무너지고 피어나는 존재다. 그녀의 선택은 미친 것이 아니라, 침묵의 언어로 말하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저항이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녀의 문장은 잔잔하면서도 심연처럼 깊다.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진행되지만, 그 내면은 정교하고 복잡하며,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해석하게 만든다. 이 작품이 강렬한 이유는 바로 그 조용한 파괴력 때문이다.
『채식주의자』 줄거리 요약
1부: 「채식주의자」 – 남편의 시선에서 본 영혜
이야기는 영혜의 남편,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은 ‘나’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는 영혜를 처음부터 평범하고 무난한 여성이라 여긴다. 튀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없으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여자.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고기를 모두 버리고,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계기는 꿈이었다. 피로 물든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잔혹하게 삼키는 장면을 본 뒤, 영혜는 입을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남편은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생활에 지장이 간다며 그녀를 부끄러워하고, 회사 회식에 억지로 데려간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폭력은 노골화된다. 아버지는 그녀의 고집을 억누르려 억지로 고기를 입에 넣으려 하고, 영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는다. 피가 바닥을 적시는 순간, 이 조용한 여자의 삶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다. 남편은 점점 더 그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결국 그녀를 떠난다.
2부: 「몽고반점」 – 형부의 시선, 욕망과 파괴의 경계
두 번째 장은 영혜의 형부, 인혜의 남편이 시점 화자다. 그는 한때 예술가였지만 지금은 방향을 잃은 영상 작업자. 언젠가부터 그는 영혜의 몸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특히 그녀의 엉덩이에 남아 있다는 ‘몽고반점’—즉 원초적이고 동양적인 흔적—에 강한 환상을 품는다.
그는 영혜에게 꽃을 그린다. 몸 전체를 캔버스로 삼고, 꽃과 덩굴이 그녀의 피부 위에 얽히는 영상을 찍는다. 작업은 점점 에로틱한 경계로 흐른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도 같은 문양을 그리고, 둘은 꽃으로 덮인 채 성관계를 가진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남지만, 곧 가족에게 발각되고 그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에게 영혜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심미적 대상일 뿐이었다. 그의 욕망은 예술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3부: 「나무 불꽃」 – 언니 인혜의 고백, 돌봄과 붕괴의 서사
마지막 장은 언니 인혜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가족 모두가 떠난 후, 그녀만이 영혜 곁에 남아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혜는 점점 식물이 되기를 갈망한다. 물만 마시고, 햇빛을 받아들이며,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말한다. 인간의 언어를 멀리하고, 걷기를 거부하고, 결국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인혜는 지친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고, 남편도, 부모도, 동생도 잃은 채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병실 끝에서 나무처럼 웅크린 동생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불안, 분노, 동정,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을 느낀다. 영혜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 한다. 언어가 닿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인혜는 여전히 그를 ‘돌보는’ 존재로 남는다.
식물이 된다는 것, 인간이기를 멈춘다는 것
『채식주의자』는 ‘몸’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작품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폭력, 보이지 않는 억압, 그리고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해묵은 강제들이 이 소설 속 인물들을 잠식해간다. 그 가운데 영혜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길 멈추려 한다. 그녀는 식물이 되기를 원한다. 물과 햇빛만으로 존재하며, 아무도 해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선택은 타인에게는 광기로 비치지만, 영혜에게는 오히려 해방이다. 그녀는 말 대신 몸으로 거부한다. 자신의 욕망도, 다른 이의 기대도,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한강의 문학은 이처럼 날카롭고도 조용하다. 『채식주의자』는 정해진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독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상은 누가 정하는가. 침묵은 언제 저항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