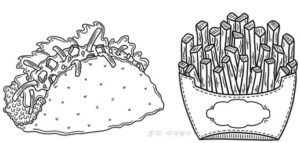
편의식품의 시대(1950-1960년대)
19세기 초, 프랑스의 제과업자이자 발명가 니콜라 아페르(Nicolas Appert)가 밀봉된 유리병에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식품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그의 발명은 통조림을 비롯한 근대적 식품 보존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계기로 보존식품 수요가 커지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유럽의 식량난과 병참을 지원하기 위해 고칼로리·장기 보존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즉석식품 기술과 대량생산 체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전후 미국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결합된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냉동식품과 통조림, 인스턴트 제품이 일상화되면서 ‘편의식품(convenience food)’은 현대적 생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당시 식문화의 중심에는 효율과 시간 절약이 있었으며, 이러한 식품들은 새로운 시대의 편리함을 상징하는 발명품으로 여겨졌다.
정크푸드의 등장(1972년)
‘정크푸드(junk food)’라는 표현이 대중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2년이다. 미국의 영양학자이자 소비자 운동가 마이클 F. 제이콥슨(Michael F. Jacobson)은 1971년에 공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를 공동 설립하고 대중의 식품 선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밀도는 낮은 가공식품을 ‘정크푸드’로 규정하며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 (참고로 ‘junk food’라는 표현 자체는 1950년대 인쇄물에서도 확인된다.)
비판의 언어로 확산(1970-1980년대)

정크푸드는 단순히 영양 불균형을 지적하는 용어를 넘어 가공식품 산업 전반을 비판하는 사회적 언어로 확산되었다. 언론과 다큐멘터리에서는 ‘정크푸드 세대’, ‘정크푸드 문화’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비만과 아동 건강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연결되었다.
이 시기 정크(junk)라는 단어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와 의미가 결여된 소비품을 지칭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정크푸드는 점차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어로 자리 잡았다.
대중화와 반성(199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정크푸드라는 단어는 일상 언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정크푸드를 줄여야겠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고, 이 표현은 더 이상 학문적이거나 비판적인 용어가 아니라 생활 속 자각의 언어로 자리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정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fast food’, ‘snack food’, ‘treat’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공중보건과 정책 담론에서는 여전히 정크푸드세(junk food tax)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규제의 언어로 남았다.
과학적 정의보다 문화적 개념
오늘날 정크푸드는 특정 영양학적 기준으로 엄밀히 정의되기보다는 문화적·심리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는 개념에 가깝다. 칼로리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 중독적 소비를 유발하는 가공식품,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 속에서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정크푸드는 단순한 식품 분류어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소비, 쾌락과 자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언어로 남아 있다.